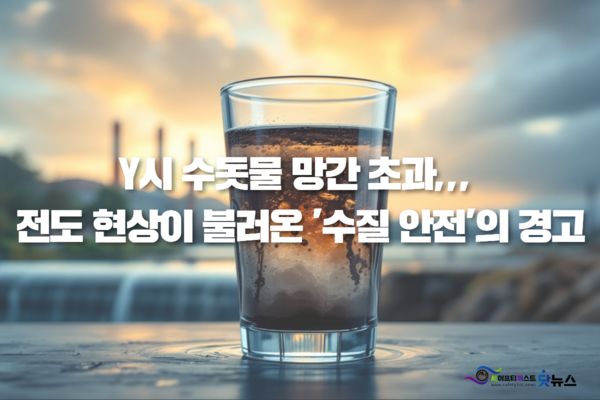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12월 초에 Y시 지역 수돗물의 망간 농도가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망간 검출 함량은 수돗물의 망간 농도 기준치(0.05ppm)보다 0.003ppm 높은 0.053ppm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해당 정수장의 취수원은 댐 원수를 이용하며, 댐의 전도 현상에 의해 정수장으로 높은 농도의 망간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망간 농도가 초과된 Y시의 경우, 동절기인 12월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주요 댐의 전도 현상 발생 시기는 일반적으로 봄철(2~4월)과 가을철(10~12월)이다. 특히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수온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댐의 위치, 수심, 주변 환경, 기상 조건 등에 따라 전도 시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강수량, 일조량, 바람 등 기상 조건의 변화도 전도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추운 겨울에서 여름으로 건너뛰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다 갑자기 추운 겨울이 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댐의 수온 변화와 그로 인한 전도 현상도 예전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Y시의 평균 기온이 11월 중순까지 10℃ 이상을 유지하다 이후 갑자기 10℃ 아래로 낮아졌다. 전도 현상이 예년에 비해 늦게 발생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댐 원수 및 정수장 수질 관리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댐의 전도 현상이 발생할 때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망간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자.
호소는 여름과 겨울에는 표층과 하층이 순환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의 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봄과 가을에는 수표면의 기온이 4℃가 되어 물의 밀도가 최대가 되면 표층의 물이 하층으로 이동하고, 하층의 물은 상층으로 올라오면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주로 바람이 부는 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하며, 물이 전도되면서 바닥에 침전되어 있던 유기물과 영양 염류가 물과 함께 표면으로 상승해 녹조 현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하부 오염 물질이 상승하면서 호수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져 상수 취수에 악영향을 준다.
망간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성층 기간 동안 저수지 심층부가 햇빛이 닿지 않고 산소 공급이 부족한 혐기성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 환경에서는 망간 이온의 용해도가 높아져 심층수에 고농도로 축적된다. 전도 현상이 발생하면 심층에서 고농도로 축적된 망간이 표층으로 이동하며 전체 수체의 망간 농도가 높아진다. 심층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면서 용존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망간이 산화되어 불용성 망간 산화물로 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물의 색이 검게 변하거나 탁도가 증가할 수 있다.
수돗물의 수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기상, 수온, 수심, 유량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도 현상의 발생 시기와 강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댐 내부 다양한 지점에서 수질 지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수온, 용존 산소, 망간, 철, 탁도 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심층수의 수질 변화를 집중적으로 관찰해 전도 현상으로 인한 수질 악화를 조기에 감지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수질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정수장과 관련 기관에 경보를 발송하는 자동 경보 시스템도 필요하다.
전도 현상 발생 시에는 수질 관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 수심별 수질 변화를 고려해 취수 방식을 조절하거나, 심층수의 수질이 악화되었을 경우 표층수를 위주로 취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심층의 용존 산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 폭기 장치를 설치하거나 수중 펌프를 이용해 물을 순환시키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심층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전도 현상으로 인한 수질 변화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정수 처리 공정도 강화해야 한다. 전도 현상으로 인해 원수의 망간, 철, 탁도 등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 산화 처리(염소, 과망간산칼륨, 오존 등), 응집 침전, 여과 등 정수 처리 과정을 추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특히 망간 제거를 위한 특화된 처리 공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정수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응집제, 소독제 등)도 수질 변화에 맞춰 투입량을 적절히 조절해 정수 처리 효율을 유지하면서 약품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종탁의 생각정원: http://blog.naver.com/avt17310
관련기사
- 진성전문가되기 68부 - 현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는 고수의 자세
- 진성전문가되기 67부 - 침수방지 위한 빗물저류조 설계, 이론 넘어선 안전의식
- 진성전문가되기 66부 - 범위 밖에서 답을 찾다: 진정한 가치 향상을 위한 사고의 전환
- 진성전문가되기 65부 - 구태의연한 설계, 현장 목소리를 외면할 때 찾아오는 위기
- 진성전문가되기 70부 - 안전은 법을 넘어선 가치,, 엔지니어의 역할과 책임
- 진성전문가되기 71부 - MBR 공정, 수질 안정과 분리막 오염 사이의 딜레마
- 진성전문가되기 72부 - 경계에 갇힌 설계, 깊어진 하수관로
- 진성전문가되기 73부 -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엔지니어의 판단이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