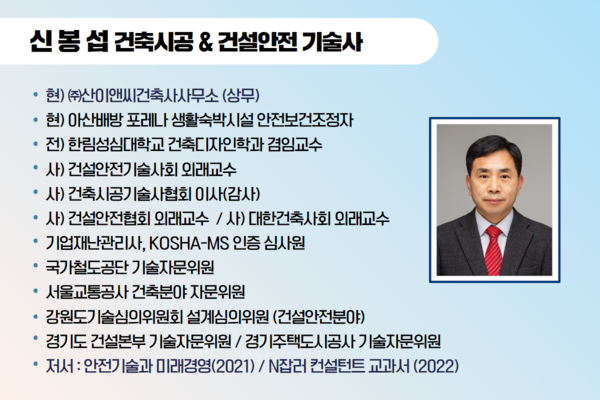[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만”이란 글자를 한자로 보면 일만(萬), 물굽이(灣), 찰(滿), 저물(晩), 게으를(慢), 질펀하게 넘칠(漫) 등이 있고, 만백성, 만만세 등 만이 의미하는 것은 중(重)함을 알 수 있다.
만(卍)은 불교적으로 인도에서 전해오는 길상(吉祥)의 상징으로서, 한자 사전에서는 불상의 가슴, 손, 발 등에 그려넣어 공덕(功德)이 원만함을 나타내는 상(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불교의 성자인 아라한(阿羅漢)을 신앙 대상으로 구복(求福)하면서 내우외환을 없애기 위해 행하는 불교의식인 만다라(曼茶羅), 모든 덕이 모이게 한다는 의미인 길상만덕, 만불상 등의 용어를 엿볼 수 있다. 안전에서는 사망사고 만인율(萬人比率), 만의 하나(萬의 하나), 천만 다행(千萬多幸) 등의 용어가 눈에 띤다.
작업장의 근로자 입장에서 그날의 컨디션, 심리상태 등에 의해 한결같이 완벽한 작업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작업장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추구 하지만, 완전한 생산시설 및 생산환경에 기반한 작업발판 및 작업장이 근로자들에게 주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노릇이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에서 만번의 한번쯤은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나 작업 행동에 실수가 있을수 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위험한 상황이 자신에게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아찔한 순간을 간혹 경험하곤 한다. 동절기 블랙아이스 때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눈이 쌓이거나 비가 오는 도로에서 앞선 사고 장면을 미리 감지하지 못해 사고 차량과 부딛칠 위험을 가까스스 피할 수도 있다. 급하다는 핑계로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다른 차와 충돌할 뻔한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아찔한 상황들처럼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천만다행'으로 사고나 재해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를 '아차사고(Near Miss)'라 한다. 자칫 경험을 자성없이 요행으로 넘겨버릴 경우 또다시 같은 실수를 재발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재해발생메카니즘에서 안전사고 직접 원인의 10%만이 불안전한 상태인 물적요인에서 발생하고, 대다수인 88%는 불안전한 행동인 인적요인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인적요인은 생리적 요인인 피로, 영양과 에너지 대사, 적응과 부적응 등과 심리적 요인인 착각, 의식의 우회, 무의식, 주의력 결손, 억측 판단, 소질적 결함, 걱정, 지름길 반응, 망각, 생략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인적요인은 무려 13가지 사항이 있으니 '만번에 하나'까지 거스름 없이 모두 제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만번의 작업 상황 및 작업 행동 중에 단 한번도 인적요인에 해당하는 실패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을 어찌할 수 있으며,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천후요인(천재지변)이라는 직접 원인을 '만일에 하나'라도 제어되지 못하였을 때 그 결과는 3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첫째는 아차사고로, 사건(Event)이 발생하였으나 물적피해나 인적피해가 수반되지 않은 천만다행(千萬多幸)인 상황이다. 둘째는 사건(Event)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물적피해인 건설사고가 일어난 상황이다. 셋째는 사건에 의해 물적피해를 우선 내버려 두고라도 인적피해가 유발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결국 사건으로부터 출발하는 사고와 재해는 '예방과 재발방지'라는 보증적 조치에 의해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후 요인과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을 제외하고는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의해 통제할 수 있다는 보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이다.
작업장에서 어떠한가? 고소의 비계 위나 배관 파이프 위를 이동하다 미끄러지면서 떨어질 뻔한 상황,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다가 사다리가 전도되었으나 다행으로 옆의 지지물을 붙잡아 다치지 않고 넘어간 상황,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졌으나 천운으로 몸을 비켜 떨어져 다치지는 않은 상황,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치일 상황에서 다행이 운전원이 미리 발견하여 충돌을 피한 상황, 골조작업 현장을 순찰하던 중 넘어졌으나 다행이 바닥의 노출 철근이 아닌 곳으로 넘어져 찔림 재해를 피한 상황 등 우리는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아차사고와 직면하게 된다.
완전한 생산시설 및 생산환경에 기반한 쾌적한 작업환경이 근로자들에게 원천적으로 주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감안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어내려면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의해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후 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같은 일을 않기 위하여는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위험 상황을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안전의 관리적 대책이다.
고소작업이 있을 예정이면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대' 설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고소작업상의 '낙하물 발생에 대비하여 방호망-방호선반'을 검토하여야 한다. 작업에 있어서는 안전하게 오르내기기 위한 통로시설(가설계단, 추락방지대 등)을 검토하고, 근로자가 실수 또는 돌발상황으로 떨어짐에 대비하여 안전모와 턱끈, 안전대와 안전대 고리 체결을 지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관점에서는 주간공정표 등에 의해 작업공정이 예정되면 작업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좋은 상황을 소설(Fiction)로 극작(劇作)하고, 좋게 마무리 하자(Happy Ending)는 것이 다른 의미의 위험성평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작업공정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단위작업이 수만가지 상황으로 이루어진다면 결코 위험성평가표상에 그 모든 상황을 수렴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 작업 상황에 대한 순회점검을 통해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을 발견하고, 즉응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이행함으로서 해당 단위작업의 해피앤딩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것도 거져는 없다. 물질적이든, 금전적이든, 행위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고귀한 가치이고 최고 가치의 복지인 근로자의 안녕을 지켜내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안전의 관리적 대책일 것이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거나 또는 위험하게 일하는 모습이 버젖이 있음에도 귀찮으니즘과 태만으로 방관자가 되어어서는 안된다. 혹시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안전에 대한 역량이 부족해서 보고도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조적인 시각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관리자의 직무 회피가 '만에 하나' 일지도 모를 사고를 '천만다행'으로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다.
안전은 관심과 표현의 산물이다.
거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