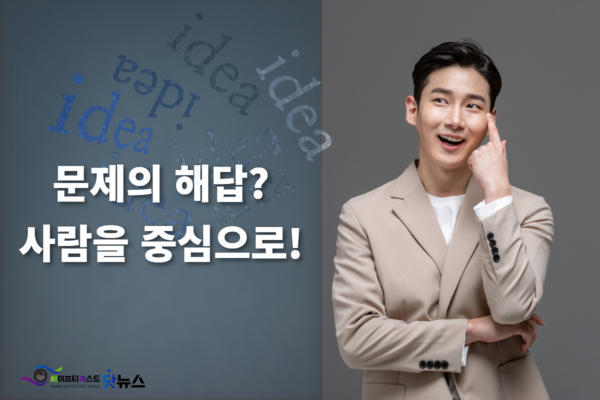
어느 현장에서 연락이 왔다. “시험 운전을 하는데 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많아 하수가 넘칠 것 같다”며, 보내 준 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봐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보고서 내용을 확인 후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현장여건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며칠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께요” 하고는 통화를 끝냈다.
그가 말한 “◯◯현장의 펌프장”은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집단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유입시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이다. 이 집단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외부와 격리되어 있어서 시설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고서의 내용이 현장여건과 조금 다를 수 있다.
펌프장은 ‘계획시간최대하수량’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시설용량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1년 동안 생활하수가 발생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1년 365일 중 생활하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루 동안의 하수량을 ‘일최대하수량’이라고 한다. ‘시간최대하수량’은 일최대하수량이 발생되는 하루 24시간동안 하수발생량이 가장 많은 한 시간 동안의 양이다. 다시말해서 ‘시간최대하수량’은 1년 365일을 한 시간 단위로 쪼개 분석했을 때 발생량이 가장 큰, Peak 시간대의 하수량이다. 그래서 시간최대하수량은 일최대하수량에 비해 큰 값이 된다. 참고로, 장래 20∼30년 후를 내다보고 하수발생량을 추정하며, 그 값을 기준으로 시설물을 계획하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말을 붙인다.
정리하면, 펌프장은 생활하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간대, 즉 Peak 시간대에 발생되는 생활하수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시간최대하수량’을 기준해서 구조물(수조) 크기, 펌프 용량 및 압송관로 관경 등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운전을 하는데 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많아 하수가 넘칠 것 같다”는 말은 구조물(수조) 크기와 펌프 용량이 유입되는 하수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만약 정말 하수가 넘친다면, ‘집단시설’에서 발생되는 시간최대 하수량에 비해 수조 크기와 펌프 용량이 작다는 말이 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 자세한 건 현장과 시설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가 보내준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 한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계획일최대하수량에 ‘1.5’를 곱하여 계획시간최대 하수량을 산정한 부분이다.
대학에서 배우는 교재나 우리나라 국가하수도 설계 기준, 하수도시설 기준등에는 "계획시간최대하수량 = 계획일최대 하수량 ×(1.3 ∼1.8)" 으로 표기되어 있다. 대학교때부터 시간최대하수량은 일최대하수량의 ‘1.3∼1.8배’ 라고 배운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설계할 때 ‘1.3∼1.8’이라는 factor값을 아무 의심없이 사용하고 있다.
실제 이 현장에서는 ‘1.3∼1.8’이라는 범위안에 있는 ‘1.5’라는 값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값이 맞아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다. 즉, ‘1.3∼1.8’이라는 factor 값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물론 현장에서 실제 발생되는 값이 ‘1.3∼1.8’보다 작으면 Peak때 발생되는 하수량이 계획한 값보다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 값이 ‘1.3∼1.8’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지금 이야기하는 현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다면 왜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1.3∼1.8’이라는 factor값이 실제 현장과 다를까? 이는 사람들의 물사용 패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하수가 발생되는 패턴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물사용 패턴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사용한 물이 하수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대학교, 대규모 기숙사, 대형쇼핑몰, 상업시설, 식당들이 모여있는 먹거리 골목, 군부대 등이 우리 가정의 물사용 패턴과 동일할까? 모든 시설의 물사용 패턴이 똑같을까? 당연히 똑같지 않다. 시설마다, 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의 물사용 패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3∼1.8’이라는 factor 값 또한 지역이나 시설물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3∼5'이상으로 높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Factor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 '1.3∼1.8'이라는 값을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 실제 하수도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하수 발생량이 Peak가 될때 하수관로 용량 부족, 하수처리장 유입펌프장 용량 부족, 유량조정조 용량 부족과 하수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여러 현장들에서 실제 일어나고 현상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매뉴얼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수치가 다가 아니다. 그냥 표준값이고, 참고값이다. 현장에 맞는 값을 찾아서 적용해야 한다.
그 값을 어떻게 찿냐고? 의심하고 생각해보면 답이 보인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꾸 기술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매뉴얼 중심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사람’을 봐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살펴야 한다. 그래야, 기술과 매뉴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현장의 경우, 외부와 격리된 사람들이 ‘집단시설’안에서 식사, 빨래, 여가활동, 생산활동, 샤워, 청소 등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것도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며 생활한다. 당연히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양을 사용한다. 또한 물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하수가 배출될 수 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시설의 물사용 패턴을 조사하거나 하수발생패턴을 분석해봐야 한다.
또 하나, 펌프장의 위치다. 예를 들어, 그가 말한 펌프장이 ‘집단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상황은 달라진다. 하수관로를 타고 펌프장까지 가는 시간 동안에 하수 변동이 안정화되어 Peak 유량이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집단시설’에 바로 인접해서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다. 집단시설에 배출되는 하수는 안정화 될 시간적 여유없이 바로 펌프장으로 밀려들어온다. 펌프장은 Peak때 배출되는 하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전문가는 매뉴얼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매뉴얼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기진 의미를 잘 되새겨보고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매뉴얼에 나오는 내용만 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물론, 달달 외우면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외웠으면 그 뜻을 이해하고 현장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엔지니어들이 일 해 오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반복되었다. 다른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가 또 다른 현장에서 되풀이 되는 것이 아쉽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문제를 반복하여 발생시키는 것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깊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권오현 회장이 <초격차 리더의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통찰력은 지식이 많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경험만 쌓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지식과 경험 모두 필요하다.
통찰력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이다. 항상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세상의 트렌드를 파악해야 한다. 그 방법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직접 해보지 못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자기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의 범위를 확장해나가야 한다. 통찰력을 키우려면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 현장에 대한 나의 생각이 빗나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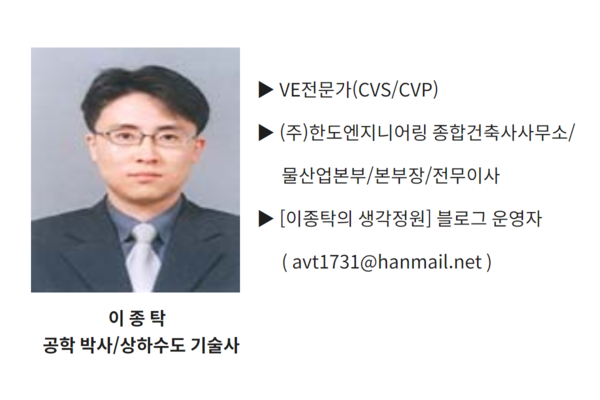
이종탁의 생각정원 링크:
http://blog.naver.com/avt17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