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잠복기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업무관련성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성 암의 특징중 하나는, 처음 발암인자에 노출된 시점부터 암 발생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만성적인 직업성 질환은 초기 노출된 유해물질이나 건강위해 영향의 종류에 따라 즉시, 또는 수십년 후에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 건강위해영향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출시점과 건강위해영향발생사이의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보건협회지 2012년 12월」에 실렸던 김수근 교수의 글을 발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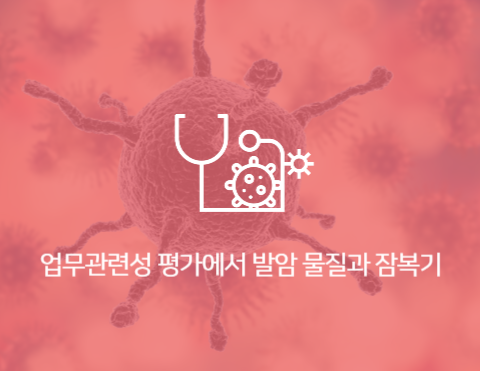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하여 잠복기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업무 관련성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잠복기는, 발암물질을 취급한 후 혹은, 암 유발 추정공정에 종사한 후 암 진단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조사하여 추정한다.
직업상 암은 잠복기가 긴데다 그 원인과 발생조건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암의 발생까지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소요된다.
즉, 과거에 노출되었던 발암물질이 현재나 미래에 암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석면은 20~40년의 잠복기가 있어 미국에서는 2010년경, 유럽에서는 2020년에, 더 늦은 일본에서는 2030년경에 흉막중피종 발생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적 노출로 인한 암 발생은 발암인자에 따라서 노출 후 암 진단시 까지 걸리는 잠복기가 다르다. 따라서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잠복기를 조사하는 것은 업무 관련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중에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며, 물론 암의 예방과 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에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암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할 때에 잠복기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혈액종양의 잠복기는 4~5년이고, 고형암의 잠복기는 적어도 10~20년, 길면 50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잠복기를 주요인정요건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며, 혈액암은 5년 이상, 고형암은 10년 이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단시 연령과 노출수준에 따라서 이보다 짧은 잠복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는 증거 가중치(weight of evidence)라는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발암물질과 해당 직업성 암들에 대해서 잠복기에 대한 최신지견을 살펴보고, 향후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 관련 칼럼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칼럼 전문을 첨부합니다-

